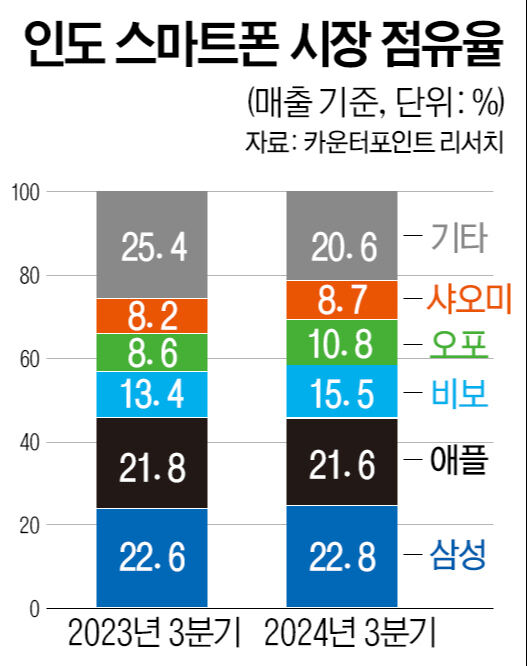지난해 진학·학업·자녀교육 등 ‘교육’ 목적으로 서울로 전입한 인구가 통계 작성 이래 가장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높은 집값에 대한 부담 등으로 ‘탈서울’ 인구가 꾸준히 늘고 있지만, 교육과 직장 때문에 서울로 이동하는 인구는 결코 적지 않았다. 정부가 서울 과밀화 해소 및 지역 균형 발전 등을 취지로 다양한 정책을 펴고 있지만, 서울로 향하는 인구를 줄이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15일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에 따르면 지난해 행정구역 경계를 넘어 서울에 전입한 인구는 120만7000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입 사유별 통계가 작성된 2013년 이래 가장 많은 수준이다.
교육 사유의 서울 전입은 2013년 6만8000명에서 2017년 7만3000명, 2020년 8만8000명으로 늘었다가 코로나19 시기인 2021년 7만6000명으로 줄었다. 이후 2022년 8만3000명, 지난해 9만2000명으로 다시 증가하는 추세다. 10년간 2만4000명이 늘었다.
7가지 전입 사유 가운데 지난해 역대 최대를 나타낸 항목은 ‘교육’이 유일하다.
내 집 마련, 전월세 계약 기간 만료 등의 ‘주택’ 사유로 서울 전입은 2013년 68만2000명에서 지난해 38만3000명으로 10년간 29만9000명이 급감했다. ‘가족’ 사유도 2013년 32만3000명에서 꾸준히 줄어 2022년 26만5000명, 지난해 27만2000명으로 나타났다.
반면 교육 외에도 직장, 교통·문화시설 등 주거환경은 서울 전입이 느는 요인이 됐다. ‘직업’ 사유는 2013년 26만7000명에서 지난해 29만명으로, ‘주거환경’ 사유는 같은 기간 3만6000명에서 7만6000명으로 증가했다.
지난해 서울 자치구별로 교육 사유의 전입을 살펴보면 강남구(9100명)가 1위로 나타났다. 대학가인 관악구(7300명)와 성북구(6900명), 동대문구(6900명)가 뒤를 이었다. 이어 노원구(6700명), 동작구(5900명), 서대문구(5200명) 순이었다. 전입자보다 전출자가 많은 ‘순유출’은 서울에서 1990년부터 지난해까지 34년째 계속되고 있다. 이 기간 순유출된 인구는 350만6000명에 달한다.
주민등록 인구통계에 따르면 서울의 총인구수는 2015년 1002만2000명을 기록한 뒤 이듬해 1000만명 밑으로 내려왔고 계속 줄어들어 지난해 938만6000명으로 집계됐다.
한편 정부는 이날 비상경제장관회의를 개최하고 ‘인구감소지역 부활 3종 프로젝트’ 추진 방안을 발표했다. 기획재정부는 지역과 생활권을 공유하는 생활인구를 늘리고자 ‘세컨드 홈’을 활성화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 내 1채를 추가로 취득해도 ‘1세대 1주택자’로 인정해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재산세 등에서 세제 혜택을 준다. 특례 대상 지역은 수도권과 광역시를 제외한 인구감소지역이다. 인구감소지역 89곳 시군구 가운데 부산 동구·서구·영도구와 대구 남구·서구, 경기 가평군 등 6곳을 제외한 83곳이 세컨드 홈 특례를 받는다.
인구감소지역 내 4억원 이하 주택을 매수할 경우 1주택자로 인정해주기로 했다. 다만 2주택자 이상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특례 지역에 1주택을 보유한 사람이 같은 지역에 있는 주택을 추가로 사는 경우에도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오현승 기자 hsoh@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