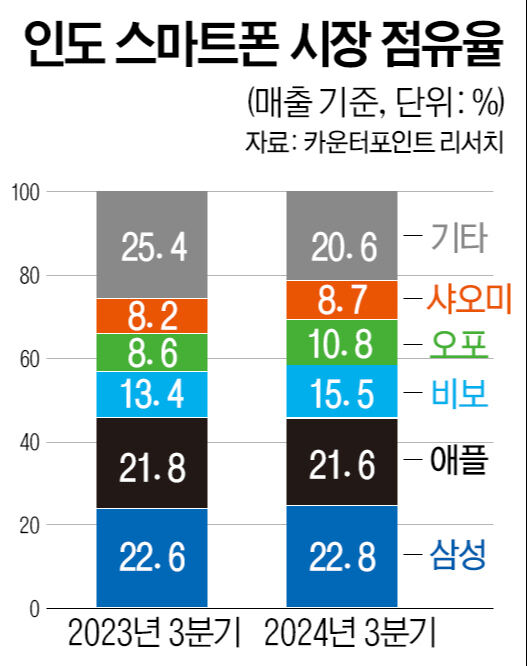“경제는 대통령이 살리는 게 아니다.”, “지금은 대통령이나 정부가 멍청한 짓 안 하고 정직하면 된다.”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지방 유세 현장에서 이재명 대표의 슬로건이었던 ‘유능한 경제 대통령’을 견제하기 위해 쏟아낸 발언 중 하나다. 이제 와서 다시 돌아보게 되는 그의 말이다.
대통령에 자리에 올랐다고 경제 성과를 바로 내기는 힘들지만 나라 안팎의 사정을 지휘해야 하는 그 자리는 혜안과 통찰력으로 미래를 내다봐야 한다.
2022년 3월 대통령에 당선되고 그해 5월 취임한 윤 대통령은 코로나19 여파로 어수선한 경제를 챙겨야 했다.
그는 전 정부의 재정 확대를 비판하며 건전재정 기조 아래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민생을 살리겠다고 했다.
그래서 세제 개편으로 대규모 감세 정책을 펼쳤고 기업들의 법인세 부담을 줄여줬다. 세수추계도 오차가 생기면서 마이너스 난 나라살림에 무게를 더했다. 이 때문에 2년 연속 역대급 세수 결손이 났다. 지난해에만 56조4000억원의 세수가 줄었는데, 올해는 35조원이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2년간 90조원이 넘는 세수펑크가 나는 것이다.
곳간이 비자 엉뚱한 곳에서 허리띠를 조르기도 했다. 외환위기 때도 줄이지 않았던 연구개발(R&D) 예산을 ‘과학계 카르텔’을 타파하겠다는 이유로 삭감했고, 이에 항의하는 카이스트 졸업생의 입을 틀어막으며 꿋꿋이 외면했다.
부동산 시장도 부정적인 신호가 잡히고 있다. 은행에 대출금을 제때 갚지 못해 경매로 넘어가는 임의경매 물건이 쏟아지고 있다. 임의경매는 2년째 급증세로 시장에서는 당분간 경매 물건이 계속 나올 것으로 내다봤다.
계엄을 선포하고 탄핵안이 국회를 통과하기 전까지 경제 성적표를 보면 대부분의 지표가 나선형의 형태로 내려갔다.
경제성장률 역시 꼬꾸라졌다. 취임 첫해 경제성장률은 2.7%에서 지난해 1.4%로 1년 만에 반 토막 났다. 코로나19로 충격을 받았던 2019년(2.3%), 2020년(-0.7%)을 제외하고 최근 10년 중 가장 저조한 수치다. 올해는 2% 초반을 겨우 유지할 전망이고, 내년이면 그마저도 위태롭다.
나라 밖에서 보는 한국의 내년 경제성장률 의심도 커졌다. 국제통화기금(IMF),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내년 성장률을 각각 2.0%, 2.1%로 기존보다 0.3%포인트, 0.1%포인트 낮춰 잡았다. 해외 주요 투자은행(IB) 여덟곳의 내년 경제성장률 전망치 평균은 1.8%였다.
국제기관들의 전망치는 비상계엄 사태로 인한 위기가 본격화하기 전에 나왔다.
지난달 초 윤 대통령은 ‘경제가 기지개를 켜고 있다’고 발언했다. 여전히 경제 흐름을 제대로 읽지 못하고 있었다.
독단적인 정책 결정이 쌓인 결과다. 대통령에게 경제의 모든 책임을 지울 순 없지만, 많은 책임이 있다. 대통령 눈치만 살폈던 경제 관료들은 하루에도 몇번씩 같은 말을 되풀이하고 있다.
문제는 눈앞에 놓인 지금이다. 한국을 ‘머니머신(money machine)’이라고 불렀던 도널드 트럼프가 백악관에 들어가기까지 한 달이 채 남지 않았다.
전세계가 트럼프 행정부를 맞이하기 위해 분주하다. 세계 각국은 트럼프와 손잡고 어떤 전략을 세울지 촉각을 세우고 있다.
트럼프는 이번 주 초 당선 후 첫 공식 기자회견을 열어 일본, 중국, 러시아 그리고 북한까지 언급하며 앞으로의 만남과 미래를 얘기했다. 하지만 거기에 한국은 없었다.
방위비 분담금 증액에 대한 압박이 있는 데다 모든 수입품에 최대 20%의 보편적 관세를 부과한다는 강력한 관세 정책에 선제 대응하기에도 모자란 시간이지만 한국의 시간은 얼어붙었다.
불확실성을 싫어하는 금융시장에 온기를 넣으려면 신속하고 명확한 판단이 필요하다. 정부와 관료들은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고 이 추위를 견뎌야 한다. 탄핵안 가결로 급한 불은 껐다지만 휘청이는 우리 경제를 세계가 주시하고 있다.
이주희 기자 jh224@segye.com